어느 날의 순광 일몰 촬영 일기 (김영갑의 사진을 보다가)
* 아래 글은 감상자의 상상력으로 작성된 독백 소설이며 원작자의 작품 의도와는 무관합니다.
 오늘도 오름에 올랐다. 근래 뜸했던 오름의 일몰 사진을 촬영하고 싶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와서 몇번째라기보다 몇년째인지를 세는 것이 빠를 것 같다. 그래도 이번엔 조금 오랫만이다. 오늘은 오름 기슭에서 오름의 능선과 일몰을 함께 담아야겠다.
몸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 언제나 삼각대를 세우고 카메라를 세팅하며 풍경을 마주할 때면 가슴이 설레는데 오늘따라 스텐 삼각대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진다.
그래도 좋다. 이렇게 세상의 풍경과 빛을 마주한다는 것이 내게는 어떤 약보다도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일몰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따라 유난히 파랗고 높은 하늘 배경으로 두터운 작은 뭉게구름들이 떠 있다. 공기 중 습기도 살짝 있어서 채도도 잘 나올 것 같다. 카메라의 앵글과 세팅을 조정한다. 6x17 중형 카메라는 주변부의 광량 저하가 심하다. 더군다나 슬라이드 필름을 장착하고 찍으려니 노출 조정이 쉽지 않다.
이제 일몰이 시작되었다. 낮아진 태양의 각도로 흰 색으로 뭉쳐졌던 빛들이 하나씩 갈라져 나온다. 그렇게 분해된 빛의 색들이 공기와 습기와 구름에 이리저리 부딪히며 형언하기 어려운 색을 만들어 낸다.
낮아지는 온도때문에 오름을 타고 내려오는 약한 바람와 셔터소리만 들린다.
지금 하늘에서 펼쳐지는 이 노을이 소리가 난다면 정말 장엄한 소리가 날 것 같다. 어쩌면 소리가 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이겠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느낌이 없다. 아직 일몰은 진행중이다. 잠시 시간이 멈춘 듯 의식이 끊긴 느낌이다.
왜 였을까?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았다. 문득 내가 보지 못한 세상이 느껴졌다. 누구보다 열심히 세상을 보고 그것을 사진에 담으려 살았는데 왜 갑자기 내 자신이 차안대를 한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서늘한 오름의 바람이 내 가슴을 뚫고 지나가는 기분이었다. 카메라에서 손을 떼고 등 뒤를 돌아 보았다.
아...
나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다.
유난히 화려하고 깊은 색을 지닌 오늘의 일몰이었지만 나는 멍한 상태로 삼각대를 돌려 나를 바라보고 있던 나무에 앵글을 맞추었다.
언제나 일몰은 해를 바라보며 역광으로 촬영했는데 이렇게 촬영하면 순광 일몰 사진이 되는 셈이다. 순광 일몰이라 참 어색한 단어 같다.
세팅을 모두 바꿔야 하니 지금 저 멋진 일몰은 더 이상 촬영하기 어려울 것 같다. 아쉬운 생각이 들지 않는다. 저런 일몰을 포기하는데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편안하다.
오늘도 오름에 올랐다. 근래 뜸했던 오름의 일몰 사진을 촬영하고 싶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와서 몇번째라기보다 몇년째인지를 세는 것이 빠를 것 같다. 그래도 이번엔 조금 오랫만이다. 오늘은 오름 기슭에서 오름의 능선과 일몰을 함께 담아야겠다.
몸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 언제나 삼각대를 세우고 카메라를 세팅하며 풍경을 마주할 때면 가슴이 설레는데 오늘따라 스텐 삼각대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진다.
그래도 좋다. 이렇게 세상의 풍경과 빛을 마주한다는 것이 내게는 어떤 약보다도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일몰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따라 유난히 파랗고 높은 하늘 배경으로 두터운 작은 뭉게구름들이 떠 있다. 공기 중 습기도 살짝 있어서 채도도 잘 나올 것 같다. 카메라의 앵글과 세팅을 조정한다. 6x17 중형 카메라는 주변부의 광량 저하가 심하다. 더군다나 슬라이드 필름을 장착하고 찍으려니 노출 조정이 쉽지 않다.
이제 일몰이 시작되었다. 낮아진 태양의 각도로 흰 색으로 뭉쳐졌던 빛들이 하나씩 갈라져 나온다. 그렇게 분해된 빛의 색들이 공기와 습기와 구름에 이리저리 부딪히며 형언하기 어려운 색을 만들어 낸다.
낮아지는 온도때문에 오름을 타고 내려오는 약한 바람와 셔터소리만 들린다.
지금 하늘에서 펼쳐지는 이 노을이 소리가 난다면 정말 장엄한 소리가 날 것 같다. 어쩌면 소리가 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이겠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느낌이 없다. 아직 일몰은 진행중이다. 잠시 시간이 멈춘 듯 의식이 끊긴 느낌이다.
왜 였을까?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았다. 문득 내가 보지 못한 세상이 느껴졌다. 누구보다 열심히 세상을 보고 그것을 사진에 담으려 살았는데 왜 갑자기 내 자신이 차안대를 한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서늘한 오름의 바람이 내 가슴을 뚫고 지나가는 기분이었다. 카메라에서 손을 떼고 등 뒤를 돌아 보았다.
아...
나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다.
유난히 화려하고 깊은 색을 지닌 오늘의 일몰이었지만 나는 멍한 상태로 삼각대를 돌려 나를 바라보고 있던 나무에 앵글을 맞추었다.
언제나 일몰은 해를 바라보며 역광으로 촬영했는데 이렇게 촬영하면 순광 일몰 사진이 되는 셈이다. 순광 일몰이라 참 어색한 단어 같다.
세팅을 모두 바꿔야 하니 지금 저 멋진 일몰은 더 이상 촬영하기 어려울 것 같다. 아쉬운 생각이 들지 않는다. 저런 일몰을 포기하는데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편안하다.
 이 나무와 풍경들이 그동안 내가 일몰을 쳐다보며 헉헉대던 모습들을 가만히 쳐다보았으리라 생각하니 조금 얼굴이 뜨거워졌다.
이들은 그동안 나를 계속 보고 있었을까? 아니면 나와 함께 일몰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이 풍경이 일몰을 하던 태양이 매일 보았던 장면이었겠구나.
셔터를 누르면서 이런 저런 상념에 잠긴다.
나는 그동안 세상의 반만 보고 살았던 셈이구나... 돌아서도 여전히 아름다운 세상이고 화려한 일몰의 빛이 비추는 세상인데 글자 그대로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렸구나...
이쪽이 더 편안하고 아름다운 풍경일지도 모르는데 그 지난 시간을 내 욕심에 뺏겨 잃어 버린 것만 같아 아쉬워졌다.
찰칵~
셔터 소리에 문득 정신이 들었다.
돌아서보니 일몰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다시 세팅하고 남은 일몰사진을 찍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일몰 하늘의 느긋함이 내 마음에 슬쩍 비치는 느낌었다.
이 나무와 풍경들이 그동안 내가 일몰을 쳐다보며 헉헉대던 모습들을 가만히 쳐다보았으리라 생각하니 조금 얼굴이 뜨거워졌다.
이들은 그동안 나를 계속 보고 있었을까? 아니면 나와 함께 일몰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이 풍경이 일몰을 하던 태양이 매일 보았던 장면이었겠구나.
셔터를 누르면서 이런 저런 상념에 잠긴다.
나는 그동안 세상의 반만 보고 살았던 셈이구나... 돌아서도 여전히 아름다운 세상이고 화려한 일몰의 빛이 비추는 세상인데 글자 그대로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렸구나...
이쪽이 더 편안하고 아름다운 풍경일지도 모르는데 그 지난 시간을 내 욕심에 뺏겨 잃어 버린 것만 같아 아쉬워졌다.
찰칵~
셔터 소리에 문득 정신이 들었다.
돌아서보니 일몰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다시 세팅하고 남은 일몰사진을 찍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일몰 하늘의 느긋함이 내 마음에 슬쩍 비치는 느낌었다.
 나는 이제서야 일몰의 태양이 자신의 빛으로 만들며 매일 바라보았던 그 세상의 풍경을 보았던 것이었다.
나는 이제서야 일몰의 태양이 자신의 빛으로 만들며 매일 바라보았던 그 세상의 풍경을 보았던 것이었다.
 = (끝) =
= (끝) =
- 김영갑 갤러리 두모악에서 그분의 사진 작품 중 하나를 보며 그려 보았던 상상입니다.
- 김영갑을 대표명사로 사용해서 고 김영갑 작가님의 이름에 별다른 호칭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 본문에 게재된 모든 사진의 저작권은 김영갑갤러리 두모악에 있습니다.
김영갑의 제주 오름 사진은 2000년대 초반에 이런 저런 경로로 알게 되었다. 그 당시 보았던 사진은 흑백과 부드러운 칼라톤의 오름과 억새 사진들이었다.
특별한 주제 피사체가 눈에 걸리지 않는 나즈막한 오름만 있는 사진이었지만 그 오름 사이의 공기들과 바람과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마음들이 담긴 듯 기억이 오래도록 남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까지는 김영갑이 생존해 있었을 시기였다. 하지만 그의 개인사를 알 리 없는 나는 그렇게 '아... 좋은 사진이구나' 하고 지나치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이십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서 그의 갤러리에 방문하게 되었다.

 아직은 봄기운이 약해서 쌀쌀한 기온에 굵은 빗방울이 몰아치던 제주의 오후였다. 성산포 인근에서 내륙쪽으로 좀 들어가서 있던 김영갑갤러리 두모악에 방문하게 되었다.
그가 사용했던 카메라는 후지 파노라마 G617 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래도 중형판 필름의 1:3 비율의 카메라다보니 주변부의 광량 저하가 극심한 기종이다. 이런 기종으로 센터 필터에 슬라이드 필름까지 쓴다면 노출시간이 만만치 않을테니 아마 삼각대를 필수 였을 것이다. (삼각대도 스텐 삼각대로 무게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 때 김영갑의 몸 상태는 그리 좋지는 않았을 것 같은 짐작이다. 그리 쉽지 않은 촬영 환경이었으리라 생각되었다.
그런 저런 생각을 하며 그의 갤러리를 둘러 보았다. 갤러리는 길쭉한 형태였는데 좁은 면 양 끝에 대표 사진을 걸어두고 긴 면에 여러 사진을 배치해 두었었다. 이 대표 사진 중 하나가 첫번째 사진이었다.
아직은 봄기운이 약해서 쌀쌀한 기온에 굵은 빗방울이 몰아치던 제주의 오후였다. 성산포 인근에서 내륙쪽으로 좀 들어가서 있던 김영갑갤러리 두모악에 방문하게 되었다.
그가 사용했던 카메라는 후지 파노라마 G617 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래도 중형판 필름의 1:3 비율의 카메라다보니 주변부의 광량 저하가 극심한 기종이다. 이런 기종으로 센터 필터에 슬라이드 필름까지 쓴다면 노출시간이 만만치 않을테니 아마 삼각대를 필수 였을 것이다. (삼각대도 스텐 삼각대로 무게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 때 김영갑의 몸 상태는 그리 좋지는 않았을 것 같은 짐작이다. 그리 쉽지 않은 촬영 환경이었으리라 생각되었다.
그런 저런 생각을 하며 그의 갤러리를 둘러 보았다. 갤러리는 길쭉한 형태였는데 좁은 면 양 끝에 대표 사진을 걸어두고 긴 면에 여러 사진을 배치해 두었었다. 이 대표 사진 중 하나가 첫번째 사진이었다.

 나는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일출과 일몰의 사진을 촬영한다. 평상시보다 많은 빛의 변화들이 있기에 화려한 색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멋진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한 그 때 그 사진을 포기하고 돌아서서 순광으로 보이는 일몰, 일출의 빛을 보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그 나무는 오름의 일몰을 찍어보겠다고 이리 저리 뛰어다니며 머리를 싸매던 김영갑의 모습을 뒤에서 오랜 날 동안 담담히 쳐다보았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일몰은 하늘의 전체에서 진행되고 화려하고 멋진 일몰의 빛이라면 역광말고도 순광의 빛도 아름답기는 마찬가지겠지만 사람들은 역광의 화려함에 눈을 뺏겨 세상 전체에 내려지는 그 빛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어쩌면 김영갑에게도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촬영일은 아마 다른 날들보다 화려한 일몰이 진행 되었을 것이다. 구름도 작고 두터우면서 작은 조각들이라 여러 색을 지니게 될 것이고 그 뒤로 비치는 하늘색도 맑고 높은 푸른색, 공기중에 살짝 떠 있는 습기들도 최고의 일몰 장면을 도와주고 있었을 것이다.
필름 카메라여도 셔터를 누르면서도 결과물이 보일 때가 있다. 가슴이 두근대는 느낌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서둘러 촬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어떤 바람이 그를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그는 삼각대를 돌려 그 화려한 일몰을 등지고 이 프레임을 잡았다.
일몰을 바라보는 나무였을까? 일몰을 만드는 태양이 보는 세상의 모습이었을까?
그저 다른 사람들이 잘 보지 않았던 장면을 촬영해 보고 싶어였을까?
나는 그것을 알 길이 없다. 다만 그는 어느 순간 일몰 세상의 남은 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시선을 사진에 담게 되었다.
어찌보면 참 쉬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저 돌아서서 셔터 누르면 그 뿐이다. 물론 일몰 역광에 비해 노출도가 다르니 약간 세팅 손볼 것이야 있겠지만 그리 큰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은 스스로의 습관이나 편견을 벗어야 가능할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일출과 일몰의 사진을 촬영한다. 평상시보다 많은 빛의 변화들이 있기에 화려한 색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멋진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한 그 때 그 사진을 포기하고 돌아서서 순광으로 보이는 일몰, 일출의 빛을 보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그 나무는 오름의 일몰을 찍어보겠다고 이리 저리 뛰어다니며 머리를 싸매던 김영갑의 모습을 뒤에서 오랜 날 동안 담담히 쳐다보았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일몰은 하늘의 전체에서 진행되고 화려하고 멋진 일몰의 빛이라면 역광말고도 순광의 빛도 아름답기는 마찬가지겠지만 사람들은 역광의 화려함에 눈을 뺏겨 세상 전체에 내려지는 그 빛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어쩌면 김영갑에게도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촬영일은 아마 다른 날들보다 화려한 일몰이 진행 되었을 것이다. 구름도 작고 두터우면서 작은 조각들이라 여러 색을 지니게 될 것이고 그 뒤로 비치는 하늘색도 맑고 높은 푸른색, 공기중에 살짝 떠 있는 습기들도 최고의 일몰 장면을 도와주고 있었을 것이다.
필름 카메라여도 셔터를 누르면서도 결과물이 보일 때가 있다. 가슴이 두근대는 느낌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서둘러 촬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어떤 바람이 그를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그는 삼각대를 돌려 그 화려한 일몰을 등지고 이 프레임을 잡았다.
일몰을 바라보는 나무였을까? 일몰을 만드는 태양이 보는 세상의 모습이었을까?
그저 다른 사람들이 잘 보지 않았던 장면을 촬영해 보고 싶어였을까?
나는 그것을 알 길이 없다. 다만 그는 어느 순간 일몰 세상의 남은 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시선을 사진에 담게 되었다.
어찌보면 참 쉬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저 돌아서서 셔터 누르면 그 뿐이다. 물론 일몰 역광에 비해 노출도가 다르니 약간 세팅 손볼 것이야 있겠지만 그리 큰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은 스스로의 습관이나 편견을 벗어야 가능할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
얼마전 범죄 관련 프로그램에서 프로파일러가 하는 말이 범인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범인이 어찌 성장했고 그러면서 무슨 일을 겪었고 하는 이야기는 그의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방송에서 그런 부분의 이야기는 다루지 않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였다.
맞는 말이다. 그 범인이 무슨 사연을 지녔던 그의 칼에 찔린 사람의 고통과 죽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고 쉽게 흔들린다는 뜻이기도 할 것이다.
예술 작품에서는 좋은 의미로 서사를 부여할 때가 많다. 그 작가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 작품을 만들 때 어떤 사연이 있었고.. 하면서 최종 결과물에 많은 이야기를 함께 전해주려 한다. 범죄와는 달리 이 부분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 작가의 서사가 작품의 이해나 감동에 많은 도움을 주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
얼마전 범죄 관련 프로그램에서 프로파일러가 하는 말이 범인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범인이 어찌 성장했고 그러면서 무슨 일을 겪었고 하는 이야기는 그의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방송에서 그런 부분의 이야기는 다루지 않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였다.
맞는 말이다. 그 범인이 무슨 사연을 지녔던 그의 칼에 찔린 사람의 고통과 죽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고 쉽게 흔들린다는 뜻이기도 할 것이다.
예술 작품에서는 좋은 의미로 서사를 부여할 때가 많다. 그 작가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 작품을 만들 때 어떤 사연이 있었고.. 하면서 최종 결과물에 많은 이야기를 함께 전해주려 한다. 범죄와는 달리 이 부분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 작가의 서사가 작품의 이해나 감동에 많은 도움을 주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술이라는 것은 홀로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소위 말해서 계급장 떼고 이름표 떼고도 그 작품은 여전히 굳건해야 그만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작가의 이름이나 약력 혹은 촬영 때의 사연들이 그 사진에 없는 색이나 피사체를 만들어 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술이라는 것은 홀로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소위 말해서 계급장 떼고 이름표 떼고도 그 작품은 여전히 굳건해야 그만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작가의 이름이나 약력 혹은 촬영 때의 사연들이 그 사진에 없는 색이나 피사체를 만들어 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의 유작과 그림자가 남아 있는 갤러리 두모악의 사진 속에서 처음의 저 사진에 한참을 눈과 마음이 빼았겨 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사진의 이미지를 넘어 그의 시선, 그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랬던 것 같다. 물론 짧은 식견으로 만들어 낸 나만의 상상이겠지만...
시간이 지나 내가 사진기를 들고 프레임을 잡으며 세상을 볼 때 나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될 것 같다.
'그저 보자. 목적에 매이지 말고 뭐 할려고 하는 생각, 이런 저런 계산을 일단 접어두고 그저 보는 것이 먼저다. 그것만으로도 세상의 반만 보았던 내 눈이 두 배로 넓어질지도 모른다...'
내가 보지 못한 풍경을 향해 셔터를 눌러도 사진을 찍힐 것이다. 하지만 바람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더 좁아진 풍경이 된 사진에서 이미 보지 못한 무언가를 그제서야 볼 수 있을 리는 만무할 것이다.
무엇보다 보지 못하고 사진에 담지 못한 풍경도 여전히 그곳에 있었던 아름다운 풍경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그렇게 그의 유작과 그림자가 남아 있는 갤러리 두모악의 사진 속에서 처음의 저 사진에 한참을 눈과 마음이 빼았겨 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사진의 이미지를 넘어 그의 시선, 그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랬던 것 같다. 물론 짧은 식견으로 만들어 낸 나만의 상상이겠지만...
시간이 지나 내가 사진기를 들고 프레임을 잡으며 세상을 볼 때 나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될 것 같다.
'그저 보자. 목적에 매이지 말고 뭐 할려고 하는 생각, 이런 저런 계산을 일단 접어두고 그저 보는 것이 먼저다. 그것만으로도 세상의 반만 보았던 내 눈이 두 배로 넓어질지도 모른다...'
내가 보지 못한 풍경을 향해 셔터를 눌러도 사진을 찍힐 것이다. 하지만 바람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더 좁아진 풍경이 된 사진에서 이미 보지 못한 무언가를 그제서야 볼 수 있을 리는 만무할 것이다.
무엇보다 보지 못하고 사진에 담지 못한 풍경도 여전히 그곳에 있었던 아름다운 풍경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김영갑의 사진집 속에 있던 글을 다시 적어 본다.
김영갑의 사진집 속에 있던 글을 다시 적어 본다.
"흙으로 돌아갈 줄을 아는 생명은 자기 몫의 삶에 열심이다.
만 가지 생명이 씨줄로 날줄로 어우러진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세상에 살면서도 사람들은 또 다른 이어도를 꿈꾸며 살아갈 것이다."
- 김영갑 -

- 개인적인 감상이며 혹여나 원작품의 이미지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관련 자료]
김영갑 갤러리 두모악 : dumoak.co.kr
 2022.09.30
Photography : 김영갑
Text : 하늘
SkyMoon.info
2022.09.30
Photography : 김영갑
Text : 하늘
SkyMoon.info

오늘도 오름에 올랐다. 근래 뜸했던 오름의 일몰 사진을 촬영하고 싶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와서 몇번째라기보다 몇년째인지를 세는 것이 빠를 것 같다. 그래도 이번엔 조금 오랫만이다. 오늘은 오름 기슭에서 오름의 능선과 일몰을 함께 담아야겠다. 몸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 언제나 삼각대를 세우고 카메라를 세팅하며 풍경을 마주할 때면 가슴이 설레는데 오늘따라 스텐 삼각대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진다. 그래도 좋다. 이렇게 세상의 풍경과 빛을 마주한다는 것이 내게는 어떤 약보다도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일몰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따라 유난히 파랗고 높은 하늘 배경으로 두터운 작은 뭉게구름들이 떠 있다. 공기 중 습기도 살짝 있어서 채도도 잘 나올 것 같다. 카메라의 앵글과 세팅을 조정한다. 6x17 중형 카메라는 주변부의 광량 저하가 심하다. 더군다나 슬라이드 필름을 장착하고 찍으려니 노출 조정이 쉽지 않다. 이제 일몰이 시작되었다. 낮아진 태양의 각도로 흰 색으로 뭉쳐졌던 빛들이 하나씩 갈라져 나온다. 그렇게 분해된 빛의 색들이 공기와 습기와 구름에 이리저리 부딪히며 형언하기 어려운 색을 만들어 낸다. 낮아지는 온도때문에 오름을 타고 내려오는 약한 바람와 셔터소리만 들린다. 지금 하늘에서 펼쳐지는 이 노을이 소리가 난다면 정말 장엄한 소리가 날 것 같다. 어쩌면 소리가 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이겠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느낌이 없다. 아직 일몰은 진행중이다. 잠시 시간이 멈춘 듯 의식이 끊긴 느낌이다. 왜 였을까?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았다. 문득 내가 보지 못한 세상이 느껴졌다. 누구보다 열심히 세상을 보고 그것을 사진에 담으려 살았는데 왜 갑자기 내 자신이 차안대를 한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서늘한 오름의 바람이 내 가슴을 뚫고 지나가는 기분이었다. 카메라에서 손을 떼고 등 뒤를 돌아 보았다. 아... 나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다. 유난히 화려하고 깊은 색을 지닌 오늘의 일몰이었지만 나는 멍한 상태로 삼각대를 돌려 나를 바라보고 있던 나무에 앵글을 맞추었다. 언제나 일몰은 해를 바라보며 역광으로 촬영했는데 이렇게 촬영하면 순광 일몰 사진이 되는 셈이다. 순광 일몰이라 참 어색한 단어 같다. 세팅을 모두 바꿔야 하니 지금 저 멋진 일몰은 더 이상 촬영하기 어려울 것 같다. 아쉬운 생각이 들지 않는다. 저런 일몰을 포기하는데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편안하다.
이 나무와 풍경들이 그동안 내가 일몰을 쳐다보며 헉헉대던 모습들을 가만히 쳐다보았으리라 생각하니 조금 얼굴이 뜨거워졌다. 이들은 그동안 나를 계속 보고 있었을까? 아니면 나와 함께 일몰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이 풍경이 일몰을 하던 태양이 매일 보았던 장면이었겠구나. 셔터를 누르면서 이런 저런 상념에 잠긴다. 나는 그동안 세상의 반만 보고 살았던 셈이구나... 돌아서도 여전히 아름다운 세상이고 화려한 일몰의 빛이 비추는 세상인데 글자 그대로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렸구나... 이쪽이 더 편안하고 아름다운 풍경일지도 모르는데 그 지난 시간을 내 욕심에 뺏겨 잃어 버린 것만 같아 아쉬워졌다. 찰칵~ 셔터 소리에 문득 정신이 들었다. 돌아서보니 일몰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다시 세팅하고 남은 일몰사진을 찍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일몰 하늘의 느긋함이 내 마음에 슬쩍 비치는 느낌었다.
나는 이제서야 일몰의 태양이 자신의 빛으로 만들며 매일 바라보았던 그 세상의 풍경을 보았던 것이었다.
= (끝) =

아직은 봄기운이 약해서 쌀쌀한 기온에 굵은 빗방울이 몰아치던 제주의 오후였다. 성산포 인근에서 내륙쪽으로 좀 들어가서 있던 김영갑갤러리 두모악에 방문하게 되었다. 그가 사용했던 카메라는 후지 파노라마 G617 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래도 중형판 필름의 1:3 비율의 카메라다보니 주변부의 광량 저하가 극심한 기종이다. 이런 기종으로 센터 필터에 슬라이드 필름까지 쓴다면 노출시간이 만만치 않을테니 아마 삼각대를 필수 였을 것이다. (삼각대도 스텐 삼각대로 무게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 때 김영갑의 몸 상태는 그리 좋지는 않았을 것 같은 짐작이다. 그리 쉽지 않은 촬영 환경이었으리라 생각되었다. 그런 저런 생각을 하며 그의 갤러리를 둘러 보았다. 갤러리는 길쭉한 형태였는데 좁은 면 양 끝에 대표 사진을 걸어두고 긴 면에 여러 사진을 배치해 두었었다. 이 대표 사진 중 하나가 첫번째 사진이었다.

나는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일출과 일몰의 사진을 촬영한다. 평상시보다 많은 빛의 변화들이 있기에 화려한 색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멋진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한 그 때 그 사진을 포기하고 돌아서서 순광으로 보이는 일몰, 일출의 빛을 보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그 나무는 오름의 일몰을 찍어보겠다고 이리 저리 뛰어다니며 머리를 싸매던 김영갑의 모습을 뒤에서 오랜 날 동안 담담히 쳐다보았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일몰은 하늘의 전체에서 진행되고 화려하고 멋진 일몰의 빛이라면 역광말고도 순광의 빛도 아름답기는 마찬가지겠지만 사람들은 역광의 화려함에 눈을 뺏겨 세상 전체에 내려지는 그 빛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어쩌면 김영갑에게도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촬영일은 아마 다른 날들보다 화려한 일몰이 진행 되었을 것이다. 구름도 작고 두터우면서 작은 조각들이라 여러 색을 지니게 될 것이고 그 뒤로 비치는 하늘색도 맑고 높은 푸른색, 공기중에 살짝 떠 있는 습기들도 최고의 일몰 장면을 도와주고 있었을 것이다. 필름 카메라여도 셔터를 누르면서도 결과물이 보일 때가 있다. 가슴이 두근대는 느낌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서둘러 촬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어떤 바람이 그를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그는 삼각대를 돌려 그 화려한 일몰을 등지고 이 프레임을 잡았다. 일몰을 바라보는 나무였을까? 일몰을 만드는 태양이 보는 세상의 모습이었을까? 그저 다른 사람들이 잘 보지 않았던 장면을 촬영해 보고 싶어였을까? 나는 그것을 알 길이 없다. 다만 그는 어느 순간 일몰 세상의 남은 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시선을 사진에 담게 되었다. 어찌보면 참 쉬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저 돌아서서 셔터 누르면 그 뿐이다. 물론 일몰 역광에 비해 노출도가 다르니 약간 세팅 손볼 것이야 있겠지만 그리 큰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은 스스로의 습관이나 편견을 벗어야 가능할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 얼마전 범죄 관련 프로그램에서 프로파일러가 하는 말이 범인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범인이 어찌 성장했고 그러면서 무슨 일을 겪었고 하는 이야기는 그의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방송에서 그런 부분의 이야기는 다루지 않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였다. 맞는 말이다. 그 범인이 무슨 사연을 지녔던 그의 칼에 찔린 사람의 고통과 죽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고 쉽게 흔들린다는 뜻이기도 할 것이다. 예술 작품에서는 좋은 의미로 서사를 부여할 때가 많다. 그 작가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 작품을 만들 때 어떤 사연이 있었고.. 하면서 최종 결과물에 많은 이야기를 함께 전해주려 한다. 범죄와는 달리 이 부분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 작가의 서사가 작품의 이해나 감동에 많은 도움을 주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술이라는 것은 홀로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소위 말해서 계급장 떼고 이름표 떼고도 그 작품은 여전히 굳건해야 그만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작가의 이름이나 약력 혹은 촬영 때의 사연들이 그 사진에 없는 색이나 피사체를 만들어 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의 유작과 그림자가 남아 있는 갤러리 두모악의 사진 속에서 처음의 저 사진에 한참을 눈과 마음이 빼았겨 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사진의 이미지를 넘어 그의 시선, 그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랬던 것 같다. 물론 짧은 식견으로 만들어 낸 나만의 상상이겠지만... 시간이 지나 내가 사진기를 들고 프레임을 잡으며 세상을 볼 때 나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될 것 같다. '그저 보자. 목적에 매이지 말고 뭐 할려고 하는 생각, 이런 저런 계산을 일단 접어두고 그저 보는 것이 먼저다. 그것만으로도 세상의 반만 보았던 내 눈이 두 배로 넓어질지도 모른다...' 내가 보지 못한 풍경을 향해 셔터를 눌러도 사진을 찍힐 것이다. 하지만 바람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더 좁아진 풍경이 된 사진에서 이미 보지 못한 무언가를 그제서야 볼 수 있을 리는 만무할 것이다. 무엇보다 보지 못하고 사진에 담지 못한 풍경도 여전히 그곳에 있었던 아름다운 풍경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김영갑의 사진집 속에 있던 글을 다시 적어 본다.
"흙으로 돌아갈 줄을 아는 생명은 자기 몫의 삶에 열심이다. 만 가지 생명이 씨줄로 날줄로 어우러진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세상에 살면서도 사람들은 또 다른 이어도를 꿈꾸며 살아갈 것이다." - 김영갑 -
2022.09.30 Photography : 김영갑 Text : 하늘 SkyMoon.inf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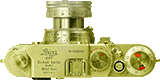




 하늘
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