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 대한 긴 이야기

사진에는 기술적인 면과 감성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한때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아주 신중하게 촬영하던 때가 있었다.
흑백이나 칼라나 모두 자가 현상하고 자가 인화하다보니 사진 한 장에 대한 후반 작업량이 많은 관계로 촬영을 많이 할 수가 없었다.
부주의하게 대충 대충 촬영하는 사진은 뭔가 모르게 무성의하고 의미없게 느껴지곤 했다.
하지만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니,
감정은 시간이 필요치 않다. 없는 감정을 만들어내는게 아니라 그저 마음속의 느낌을 그대로 느끼는대는 그야말로 단 1초의 시간조차 필요하지 않다.
같은 이유로 집중이라는 것도 필요없다. 이미 기쁘고 이미 슬프고 혹은 이미 외롭고 또는 이미 즐거운데 무엇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까...
기술적인 면들에 대해 너무 의존적이지 않고 싶었다. 가능하면 사진 한 장에 너무 많은 시간이나 고려를 하지 않으려 했다.
노출, 필름, 렌즈, 바디, 색온도, 각도, 빛의 강도와 방향, 산란, 반사, 공기의 성질, 바람, 습기, 프레이밍, 화각, 왜곡, 비네팅, 수차, 셔터, 조리개, 아웃포커싱, 색혼합, 주제부, 계조 범위, 존의 이동, 타이밍........
이 수 많은 단어들을 머리속에서 지우려 애쓴다. 대신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세상을 보고 있는가...
누군가가 한글철자법을 배우고 워드프로세서를 배우고 프린트하고 제본하는 법을 배웠다고 해서 소설이나 시를 쓰는 법을 배운것은 아니다. 어쩌면 전혀 별개의 이야기일것이다.
사진에 무언가를 담을려면 담는 방법을 마스터함에 앞서서 담을 거리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그 당시의 나의 결론이었다.
보도 사진이나 사진을 업으로 하는 프로사진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해 보았다.
신문에 담아야 할 사진은 그 사진이 차지한 공간에 수백자의 글로 써넣는것보다 더 큰 전달력이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강한 맛이 풍겨야 한다.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그 공간은 그냥 수백자의 글로 대체되고 사진은 제외될것이다.
하지만 나는 신문에 담을 사진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세밀히 천천히 봐주지 않는 (사실은 시간떼우기나 단순한 궁금증이 대부분인) 독자들의 눈에도 쉽게 뜨일만한 강한 느낌의 사진을 원하지 않는다.
나에게 사진에는 강한 메세지가 담겨야 한다는 사진기자들의 사진론에 마음이 끌리지 않는다.
그의 사진 기술이 수십년의 노하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와 나는 사진을 하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이다.
팔아야 한 사진은 고객이 사야 할 마음이 들게 하는 사진이 최고의 목표일 것이다.
불행히도 그 고객들은 대부분이 사진에 비전문적인 지식과 부족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주머니를 열게 할려면 흔히 보지 못하는 풍경이나 인물, 신기한 것들, 혹은 보통 카메라 촬영기술이나 장비로는 촬영할 수 없는 진하고 강렬한 색감이나 기법들의 사진들이어야 할 것이다.
이런 사진은 대부분 비정상적인 노출(심한 언더나 오버)이나 기타 방법들로 강렬한 색감들.. 평생 보통 눈으로는 거의 보기 힘든 어떤것들을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깊은 의미들보다는 당장 구매 욕구를 유발하는 지극히 자극적인 맛이 풍겨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 나의 경우와는 맞지 않다. 나는 사진 팔아서 먹고 살아야 하는 프로사진 작가도 아니기때문이다.
프로 사진들을 하는 사람들의 기술적 부분은 당연히 일반인에 비해서 뛰어나고 배워야 할 기술들이 많겠지만 그들의 사진의 목적까지 따라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나의 사진 속에는 강렬한 메세지도, 강렬한 톤도 강렬한 색도 인위적으로 넣으려 하지 않는다.
어쩌면 항상 보는 세상 풍경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그대로 담기를 원할 뿐이다.
내 마음이 정리되지 않고 내 마음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쩌면 껍데기일뿐이리라.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내 마음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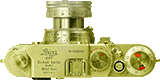




 하늘
하늘
(Logged in members can write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