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물방울의 회상 (해인사)
#0

#1

어느 물방울의 회상
나는
흘러 가는 강물 속에서
이름도 갖지 못했던 작은 물방울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흘러 가고 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작은 굽이를 돌고
너른 모래톱을 느긋히 지나
폭포 속으로 뛰어 듭니다.
그렇게 흘러 가다 보니
너무 넓고 깊어
끝을 알 수 없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곳이 바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나를 감싸던 날
몸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마침내
나는 물방울이 아닌
어떤 존재가 되어
하늘로 날아 오릅니다.
내 몸은 이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아주 작은 미풍에도
바다보다 더 큰 하늘을 날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방울이었을 때와는
비교 하지 못할만큼
가볍고 빨라졌습니다.
그때가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끝 없이 높고 넓은 세상이 보입니다.
한 없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지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이제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을까?
자유의 행복과
존재의 의심을 함께 간직한 채
나는 그렇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불어 오는
차가운 바람을 만났습니다.
내 몸이 하얗고 작은
너무나 아름다운 눈의 씨앗으로 변해갑니다.
그때가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곁에 보이지 않았던 물방울들도
저마다 다른 아름다운 눈의 결정으로 변해 가는 것이 보입니다.
곁에 있으리라 생각했었지만
그들 역시 나처럼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혼자만 있었나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반갑고 기쁩니다.
나도 그들도 사실은 한 없이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들의 손을 잡고 부둥켜 안습니다.
서로 꼭 끌어 안으니 너무도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런 포옹은 서로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가볍지도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나는 그들과 손을 잡음으로써
눈결정이 아니라 이젠 눈송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무게 때문에 하늘 위에 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땅 위로 떨어집니다.
소리 없이
숲 속, 나무 위
사르락 사르락 쌓여갑니다.
내가 내려 앉은 땅 위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위로도 계속 눈송이들이 쌓여갑니다.
내 위에 쌓이는 눈들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숨이 막히고 답답합니다.
... . . . . . . . . ...
그만 얼음이 됩니다.
꼼작도 할 수 없는
차가운 시간이 왔습니다.
난 갇혔습니다.
스스로 모습도 보지 못해 두려워하다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겨나게 되어
그저 내 곁에 아름다운 이들을 안고 기뻐한 댓가가
이렇게 차가운 눈 아래 얼음속에 갇혀버리는 것이라니...
나는 절망 했습니다.
이젠
시간도 얼어서 멈추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나를 바다에서 하늘로 보내주었던
그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날
문득 눈을 떠보니
나는
얼음 속에서 나와
또 다시 물 한방울이 되어
흘러 갑니다.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그 옛날 강물 속에서
이름 없는 물방울이었을 때
내가 어디에서 왔었는지....
2002.12.09
해인사
Canon EOS D60
Canon EF 70-200mm/F2.8 L, IS
나는
흘러 가는 강물 속에서
이름도 갖지 못했던 작은 물방울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흘러 가고 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작은 굽이를 돌고
너른 모래톱을 느긋히 지나
폭포 속으로 뛰어 듭니다.
그렇게 흘러 가다 보니
너무 넓고 깊어
끝을 알 수 없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곳이 바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나를 감싸던 날
몸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마침내
나는 물방울이 아닌
어떤 존재가 되어
하늘로 날아 오릅니다.
내 몸은 이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아주 작은 미풍에도
바다보다 더 큰 하늘을 날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방울이었을 때와는
비교 하지 못할만큼
가볍고 빨라졌습니다.
그때가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끝 없이 높고 넓은 세상이 보입니다.
한 없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지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이제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을까?
자유의 행복과
존재의 의심을 함께 간직한 채
나는 그렇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불어 오는
차가운 바람을 만났습니다.
내 몸이 하얗고 작은
너무나 아름다운 눈의 씨앗으로 변해갑니다.
그때가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곁에 보이지 않았던 물방울들도
저마다 다른 아름다운 눈의 결정으로 변해 가는 것이 보입니다.
곁에 있으리라 생각했었지만
그들 역시 나처럼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혼자만 있었나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반갑고 기쁩니다.
나도 그들도 사실은 한 없이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들의 손을 잡고 부둥켜 안습니다.
서로 꼭 끌어 안으니 너무도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런 포옹은 서로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가볍지도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나는 그들과 손을 잡음으로써
눈결정이 아니라 이젠 눈송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무게 때문에 하늘 위에 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땅 위로 떨어집니다.
소리 없이
숲 속, 나무 위
사르락 사르락 쌓여갑니다.
내가 내려 앉은 땅 위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위로도 계속 눈송이들이 쌓여갑니다.
내 위에 쌓이는 눈들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숨이 막히고 답답합니다.
... . . . . . . . . ...
그만 얼음이 됩니다.
꼼작도 할 수 없는
차가운 시간이 왔습니다.
난 갇혔습니다.
스스로 모습도 보지 못해 두려워하다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겨나게 되어
그저 내 곁에 아름다운 이들을 안고 기뻐한 댓가가
이렇게 차가운 눈 아래 얼음속에 갇혀버리는 것이라니...
나는 절망 했습니다.
이젠
시간도 얼어서 멈추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나를 바다에서 하늘로 보내주었던
그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날
문득 눈을 떠보니
나는
얼음 속에서 나와
또 다시 물 한방울이 되어
흘러 갑니다.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그 옛날 강물 속에서
이름 없는 물방울이었을 때
내가 어디에서 왔었는지....
2002.12.09
해인사
Canon EOS D60
Canon EF 70-200mm/F2.8 L, 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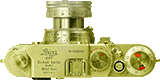




 하늘
하늘